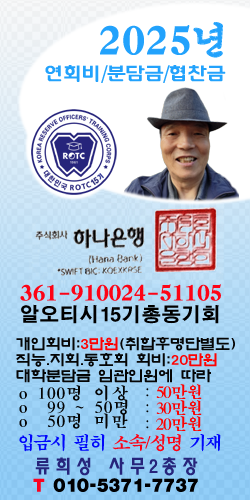박상진의 국악 이야기 23 <br>AI가 작곡한 베토벤 교향곡 10번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AI 시대에는 빅데이터가 생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AI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더 많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한다든지 애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검색 데이터, 소비 관련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병렬 컴퓨터 속에 쌓이게 된다. 이때부터 AI의 빅데이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오픈 데이터가 된다. 그야말로 AI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터넷 네트워크에 천문학적으로 쌓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빅데이터일수록 AI가 학습을 잘 한다고 한다. 학습을 잘한다는 뜻은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술 분야 중 서양음악과 국악의 경우는 어떠한가? 오늘은 먼저 서양음악의 클래식 쪽을 알아보자.
클래식 작곡·편곡은 AI가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많은 AI 음악도구들이 있어서 AI가 능력을 발휘하기에 비교적 쉬운 분야로 꼽힌다. 피아니스트인 조은아 경희대 교수는 "수백 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정형화된 화성법과 대위법, 수치화가 가능한 규칙적인 리듬과 일관된 조성(調性)이 있어서 클래식은 AI가 학습하기 좋은 장르”라고 말한다. 오래된 클래식 작품은 저작권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이렇게 AI가 학습을 통해서 작곡한 예는 ‘베토벤 교향곡 10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베토벤(1770~1827)은 제10번 교향곡을 작곡하던 중 운명하였다. 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제9번 교향곡 <합창>을 완성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베토벤은 1817년 영국 런던의 왕립필하모닉협회로부터 9번과 10번 교향곡을 함께 의뢰받았다. 베토벤은 1824년 9번 교향곡을 완성한 후 10번 교향곡에 대한 작곡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악화돼 작곡을 끝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가 남긴 ‘교향곡 10번’은 단편적인 작곡 스케치 몇 개 정도였다. 이 ‘교향곡 10번’은 250개의 음표와 40여 개 정도의 악구로 된 선율로서 연주하면 1분도 채 되지 않는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을 계기로 AI를 활용한 ‘교향곡 10번’의 작곡 복원작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음악사가(音樂史家), 음악학자, 작곡가, 컴퓨터 과학자들로 팀이 만들어졌는데, 2019년 11월 첫 결과물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때 언론인, 음악 연구자, 베토벤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AI를 활용한 ‘10번 교향곡’을 먼저 피아노 연주로 들려주면서 어느 부분이 베토벤 원곡이고, 어느 부분이 인공지능 파트인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참석자 누구도 이를 구별해 내지 못했다고 한다. 현악4중주 악보로 바꿔 실시한 테스트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조은아 교수에 의하면, 연구팀은 AI에 베토벤이 선호했던 선율과 화성 작법을 훈련시켰다고 한다. 예를 들면 베토벤의 모티브를 짧게 입력하고 이어지는 후속 악상을 AI에 예측하도록 맡기면서 실수를 교정하고 더 적절한 선율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이 시점에선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고 한다.
연구팀은, 베토벤이 남긴 ‘10번 교향곡의 스케치’는 스케르초(해학곡;가락이 경쾌한 곡)와 론도(회선곡;동일한 주제가 되풀이되며 다른 가락이 끼어드는 형식) 악장이 중심 주제일 거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교향곡의 3악장에 주로 배치되는 스케르초와 4악장에 배치되는 론도에 집중해서 AI에게 학습시켰다. 또한 충분한 입력값을 확보하고 다른 작곡가의 작품과 음악적 변별력을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이든, 모차르트 작품까지 포함해 딥 러닝 프로그램(스스로 사물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연구에 참여한 피아니스트이자 음악학자인 로베트 레빈은 "마치 열성적 학생처럼 AI도 매일 훈련하며 배우니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더라"고 말하며 AI의 꾸준한 습득력을 칭찬했다.
AI는 베토벤이 남긴 ‘교향곡 10번의 스케치’를 가지고 연주시간 20여 분 분량의 스케르초와 론도를 각각 작곡했다. 18개월의 작업 끝에 초연은 2021년 10월 9일 베토벤의 고향인 독일 본에서 인간악단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Beethoven Orchestra Bonn)에 의해 세상에 처음 울려 퍼졌다. AI가 창작한 교향곡을 연주했던 인간 연주가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감정선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집중이 힘들었다"고 불평했다. 또 "중요 주제를 연결하거나 분위기를 전환하는 에피소드 부분이 어색해 음악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라고 토로하였다.
조은아 교수는, 이제껏 AI 작곡 프로그램의 개발은 대부분 공학계열의 연구자들이 주도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인간의 작업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다. ‘베토벤 교향곡 10번’을 완성하는 작업에서도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는 인물은 딥 러닝과 코딩(정보를 계산 조작에 편리한 부호・언어로 바꾸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AI 공학자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AI가 창작하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음악성의 깊이를 추구하려면 음악가들이 보다 핵심적인 위치에서 AI의 창작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조은아 교수는 AI가 창작한 교향곡이 음악적으로 인간의 작품과 유사하게 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향곡을 연주한 이가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인간의 예술성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AI만의 창작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거부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의미 있는 반응으로서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창작 주체의 정체성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 대중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AI 작곡이 극복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다음 회에서 AI가 작곡한 ‘보허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