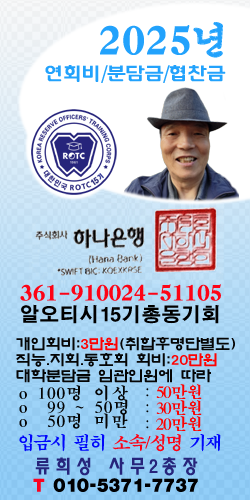박상진의 국악 이야기 21 <br>무위정치 그리고 한국음악
오늘은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국악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정치 이야기를 한다니 그렇게 보일 것이다. 어쩌면 논리가 없는 이상한 이야기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말하기 어렵다. 현실정치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전 철학박사 공부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 고전(古典) 이야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정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한다. 거기에 한국음악과 관련한 이야기는 살짝 쓰리 쿠션 정도로 얹어보려고 한다.
 박상진(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박상진(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무위(無爲)’는 도가(道家)의 핵심 사상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무위’의 뜻은 인위적인 것이 없다는 뜻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결국은 화를 부른다고 한다. 노자(老子)의 사상이다.
노자 사상의 ‘무위’라는 것은 세상의 자연스런 이치라고 하는데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근원을 따라가는 것, 즉 세상 만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위’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자(孔子)가 만들어놓은 ‘예(禮)’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애초부터 인류의 사상에는 ‘예’라는 것이 없었는데 시대가 하도 어수선해서 공자가 ‘예’를 만들어놓았더니 이제는 서로 ‘예’를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하며 따지고 있는 꼴이 되었다.
그런데 인류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행동들을 억지로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무위’의 사상인 자연스런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서 ‘인(仁,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무너지니 ’의(義, 정의)가 만들어져 진리인양 추종하게 되었다. 또 그것도 무너지니 ‘예(禮, 예의)를 추종하게 되었고 그것마저 무너지니 난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인’의 시대일까, ‘의’의 시대일까 아니면 ‘예’의 시대에서 살고 있을까? ‘정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공허하게 들린다. 각자 느끼는 정치적 체감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무위’의 시대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으로 본다. 만약에 동의하기를 꺼려한다면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엮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위’에 ‘정치’를 붙이면 ‘무위정치’가 된다. ‘무위정치’는 옛 중국의 요순시대에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태평한 시대를 말한다. ‘무위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쉽고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겠다.
첫째는 굳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답시고 설치다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것보다 백성들을 믿고 크게 간섭하지 않는, 그야말로 통큰 정치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인재를 등용할 때에는 내가 아는 사람을 알박기할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전문인을 등용하여 그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백성이 편안해지면 백성들은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광장에 나가서 핏대를 세우지 않게 하는 정치, 이것을 ‘무위정치’라고 한다.
‘무위정치’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정치를 해야 한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 자주 뒤집게 되면 모두 뭉개져서 부서지게 된다.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자꾸 정치적 생색을 내기 위해 무언가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국민들이 불안해져 대형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한 번만 뒤집어야 생선도 맛있게 구워진다. 이것이 ‘무위정치’이다.
위에서 언급한 ‘인’, ‘의’, ‘예’의 사상들은 가장 어지러웠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 무렵의 용어들이다. 이미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 사라진 위의 용어들은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살아있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정치에서 ‘인’, ‘의’, ‘예’의 사상들은 안타깝게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른바 ‘무위’ 즉 ‘무위정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음악 예술계는 어떨까? 춘추전국 시대의 어지러웠던 때에 만들어진 ‘예악사상’이 한국음악계에서는 금지옥엽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는지 각별히 신경써야 하겠다. 한국음악 예술인들이 핏대를 세우지 않게 하는 ‘무위정치’ 속에서 맘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적・제도적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정치적・제도적 관심은 우리가 짓밟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이름 없는 들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름도 몰랐던 그 들꽃들이 지금은 화려한 K-컬처의 꽃으로 피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